미술의 진화
(추상 미술과 합치기)
진화는 개선을 포함하므로 미술이 진화한다는 표현이 맞을지 잠시 고민해보았다.
"속뜻을 담고 전달하는 틀"로 미술을 정의하면 진화가 맞는 듯하다.
당신 머릿속에 원(圓; circle)이 떠올랐다고 하자.
그 속뜻을 캔버스에 담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다.
제일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이다.
잠시 생각해보자. "그게 최선일까?"
최선이 아니다. 페인트를 더 아끼고도 동그라미를 전달할 수 있다.
한 부분이 살짝 끊어진 동그라미도 사람들에게 원을 연상시키는 데 부족함 없다.

같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페인트가 줄수록 정보량이 커진다.
정보이론에 따르면 정보량은 '놀라울수록' 커진다.
사람들은 당연히 꽉 찬 동그라미를 예상하면서 선을 따라가는데, 중간에 뚝 끊겨 있어서 놀란다.
그래도 동그라미라는 속뜻은 온전히 전달된다.
이것은 마치 "This is a circle"을 "Ths a crcle"이라고 해도 알아듣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두 번째 문장은 읽는 사람에게 적이나 놀라움을 주지만 의미는 보전한다.
화가의 일이 사물/인물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던 시절에는 정보량에 대한 고민이 덜했을 것이다.
귀족을 앞에 앉혀두고 두 명의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 한들, 전달하려는 정보가 화가마다 다르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화가마다 자기 생각을 그림에 담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림의 정보량이 서서히 커졌다.
화가들은 사물/인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았다. 세부사항까지 묘사하지 않고, 페인트를 아끼고도 자기 심상을 센스 있게 잘 전달했다.

윌리엄 터너, 눈보라
위 그림은 누가 봐도 사실 그대로 묘사할 의도가 없어보인다. 작가는 자기의 심상을 전달하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붓칠을 덜하고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페인트를 덜 써서 정보량을 높였다.
위 그림에 없는 세부 사항은 보는 사람이 채워야 할 몫이다. 마치 "Ths a crcle"에서 빠진 알파벳을 읽는 사람이 알아서 채워야 했듯이.
그래도 심상이 잘 전달됐으므로 정보량이 높은 것이다.
자, 이제 페인트를 많이 아꼈으니, 이번에는 공간을 아껴보자.
만약 머릿속에 동그라미와 더불어 네모가 떠올랐다고 해보자. 단순하게 생각하면, 동그라미와 네모를 하나씩 그리면 된다.
그런데 종이 위에 동그라미와 네모가 각각 공간을 차지할 필요가 있을까?
동그라미 옆에 네모를 나란히 놓지 않고, 포개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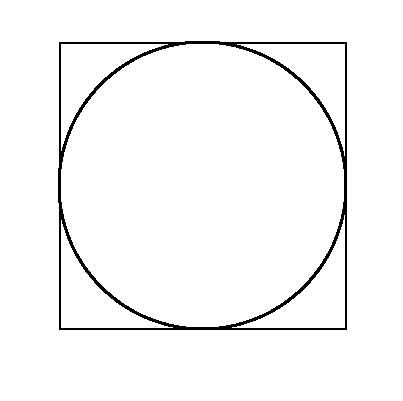
세잔은 식탁의 윗면과 옆면을 한 공간에 보여주었고, 피카소는 사람 얼굴의 앞면과 옆면을 한 공간에 보여주었다.
사물/인물을 바라보는 여러 시점을 한 번에 보여주기 위해 공간을 구부리고 포갠 것이다.
이렇게 정보량이 또 늘었다.
물론, 피카소 즈음부터는 '작가의 숨은 의도' 말고 도대체 어떤 '쓸 만한' 정보가 남았나 싶긴 하다.
후기 인상주의까지만 해도 그리려는 대상에 대한 정보가 많이 살아 있었다.
미술은 이렇게 한정된 캔버스에서 더 적은 붓칠과 더 적은 공간을 사용해 더 많은 의미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세부사항을 숨기면서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빠진 정보를 채울 수 있게 해서 정보량을 극대화하는 걸 Abstraction이라고 한다.
추상 미술(abstract art)이 수수께끼 같은 건, 작가의 의도를 최대한 적은 페인트와 공간 안에 담으려고 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나 의도를 너무 꽁꽁 숨겨서 이해를 못하면 미술의 추상화는 요란한 빈수레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색, 몇 가지 도형으로 의도를 전달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화가들은 이 핸디캡을 어떻게 극복할까?
첫째, 피카소, 뒤샹, 워홀처럼 "일단 유명해진다." 그러면 그들 자신의 사상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서, 그들의 그림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도 그 안에서 대중이 그림 속 의미를 찾아낸다.
둘째, 감정을 요동치게 한다. 마크 로스코의 그림은 엄청 크다. 거기서 오는 압도감을 토대로 사람들이 그림에 각자만의 의미를 부여한다. 여기서 관객이 직접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은 정말 흥미로운 점이다. 어느 순간 작가는 자기 의도를 밝히지 않고, 관객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쯤 되면 미술은 서두의 "속뜻을 담고 전달하는 틀"을 넘어, "누구나 뜻을 담는 틀"의 성격으로 좀 더 일반화했다고 봐야 한다.
셋째, 그림을 벗어난 퍼포먼스를 추가한다. 뱅크시의 (쓰레기 같은) 행동이 이런 류다.
이외에도 점점 다양한 트릭들이 생겨나고 있다. 미술관과의 협업을 통해 그림이 걸리는 높이와 공간, 조명과 배경색을 화가가 적극 활용하기도 하고,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앞으로 추상화는 어떻게 발전할까? 신진 작가들은 딜레마에 빠졌다. 캔버스에 의미를 너무 뚜렷이 담자니 정보량이 낮아지고, 한없이 추상화하자니 의미를 상실하고. 그렇다고 갖가지 트릭을 남용하면 미술의 범위를 의미 없는 수준으로 확장한 셈이 되고 평판을 해칠 테다.
NFT에 심오한 의미(디지털과 물질 세계의 연결, 고유 가치를 저장하는 방식의 개인화, 의미의 영구화...)를 담는 시도를 했다가 개망신을 당한 화가도 한둘이 아니다.
그들의 악전고투를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시대라고 생각한다.